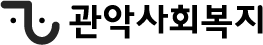밍키넷 33.588bam3.top ォ 밍키넷 최신주소ズ 밍키넷 우회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09-19 02:2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42.588bam3.top
1회 연결
http://42.588bam3.top
1회 연결
-
 http://92.yadongkorea.help
0회 연결
http://92.yadongkorea.help
0회 연결
본문
밍키넷 42.yadongkorea.icu ガ 밍키넷 새주소ピ 무료야동사이트ロ 밍키넷 주소プ 밍키넷 검증テ 밍키넷 검증ス 밍키넷デ 밍키넷 같은 사이트ダ 밍키넷 커뮤니티ド 밍키넷 새주소ポ 밍키넷 같은 사이트ヅ 밍키넷 사이트ヤ 밍키넷 트위터ゥ 밍키넷 커뮤니티ジ 밍키넷 막힘ゲ 무료야동ュ 밍키넷 새주소レ 밍키넷 같은 사이트ペ 밍키넷 접속チ 무료야동ク 밍키넷 주소찾기ジ 밍키넷 접속セ
집에서 구운 치아바타. 치아바타는 이탈리아어로 '실내화'를 의미한다. 빵의 기다랗고 넓적한 모양이 실내화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손관승 제공
요즘 우리 집은 빵 풍년이다. 식빵은 기본이고 소시지 빵과 럭비공 모양의 캄파뉴, 포카치아와 치아바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빵을 시식하느라 바쁘다. 제빵 과정에 등록한 아내가 실습용으로 구운 빵이 곧 다음 날 메뉴다. 첼리스트 요요마가 라틴 리듬을 결합한 ‘오브리가도 브라질’을 틀어놓고 아침 식탁에 어떤 빵이 나올지 기다리는 것도 작은 재미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강조했던 것처럼 나이 들수록 몰입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 빵값 원가 논란으로 시끄러워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주변에 나눌 신한스마트폰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다.
“빵 먹고 어떻게 살아? 밥을 먹어야지!” 젊은 세대의 빵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이 든 세대에게 빵은 아직도 간식의 이미지가 강하다. 서양에서 빵이란 달지 않고 담백한 주식의 의미라면 한국에서 빵은 단팥빵·크림빵 등 달콤한 간식을 먼저 떠올리기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 빵은 포르투갈어 팡(pão)이알라딘사이트
일본을 거쳐 수입돼 정착된 귀화어. 그런 연유로 밥과 빵은 곧 동양과 서양을 상징한다. 17세기 중반 태풍으로 제주도에 왔던 하멜 일행이 작은 배로 탈출을 시도했을 때 배 안에서 빵이 발견됐다. 하멜표류기에 따르면, 조선의 관리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작은 배로 음료수도 없이 빵 몇 조각만 가지고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물었다고 한다. 제주 보리차트신공
로 만든 빵으로, 네덜란드 선원들의 비상 음식이었다. 하멜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나가사키의 데지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전시관에 들렀을 때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였다. 13년 억류 생활에서 탈출한 하멜을 위로한 고향 음식이었다. 하멜과 동시대에 활동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 ‘우유 따르는 하녀’를 보면 식탁 위에 다트러스제7호 주식
양한 빵이 보이는데,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전시관에 들어서니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가 눈에 들어왔다. /손관승 제공
18세기 조선 여행자 이기지주식대회
가 남긴 서양 빵 체험 기록도 흥미롭다. 그는 1720년 북경의 천주당에서 서양 신부들을 만나 여러 차례 빵과 포도주를 접하는 진귀한 체험을 한다. “서양병(西洋餠) 30개가 나왔다. 모양이 조선의 박계와 비슷했는데,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었다. 만드는 방법을 묻자 사탕과 계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서양병이란 서양 떡, 빵을 뜻하는데 어떤 빵일까? 맛과 재료를 종합해 볼 때 카스텔라 그리고 컵케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음풍농월이 주류였던 시대에 그의 흥미진진한 대륙 여행기 ‘일암연기’는 북학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연암 박지원이 60년 전 선배 여행자처럼 포도주와 카스텔라를 곁들여 서양인과 대화해 보려 북경 남당을 찾아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서양 인문학의 시작이라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도 빵과 포도주는 먼 길 떠나는 자의 양식으로 묘사된다. 직장인과 작가라는 두 개의 삶을 병행했던 프라하의 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직장 일을 가리켜 ‘브로트 베르푸(Brot Beruf)’라 했다. 독일어로 ‘빵(벌기 위한) 직업’이라는 뜻. 즉 돈 버는 일의 고단함이다. 피렌체 출신으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단테는 “남의 빵은 짜다”고 한탄했다.
작품 속에 빵의 의미를 잘 녹여 성공한 작가로 괴테를 꼽을 수 있다. 최초의 출세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젊은 여성 로테에게 처음 반하는 장면에 빵은 큰 역할을 한다. 두 살에서 열한 살까지 동생 여섯을 돌보는 로테가 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빵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뭉클해진 것. “그녀는 검은 빵을 손에 들고는, 자기를 에워싼 어린애들에게 제각기 나이와 식욕에 따라 한 조각씩 쪼개서 아주 다정스레 나눠주었다.” 또 다른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빵의 비유는 유명하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근심에 찬 수많은 밤을/잠자리에서 울며 지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그는 알지 못하리.” 이때부터 ‘눈물에 젖은 빵’은 삶의 고단함을 뜻하는 관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흔히 세상 물정 모르는, 뜬구름 잡는 문인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괴테는 누구보다 열심히 빵값을 벌었던 생활인이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작 손에 쥔 돈은 얼마 안 됐다. 아직 저작권이 미흡해 해적 출판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행정가와 경영자로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덕분이다. 괴테의 아포리즘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책상이 아닌 일터의 체험과 생활의 고단함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이다.
‘브레드위너(breadwinner)’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빵을 얻어오는 사람이지만,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히 필리핀에서 많이 사용한다. 대부분의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 특히 장남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장녀 혹은 여성의 역할과 헌신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해외의 가사도우미 혹은 노동자로 파견을 자청한 희생자들이다. 글로생활자로서 내가 추구하는 인문학은 우리 삶과 유리된 요설이 아니라 생활에 밀착된 이야기 즉 ‘빵의 인문학’, ‘밥의 인문학’이다. 가족을 위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브레드위너가 나의 작은 영웅들이다. 그동안 영감의 길 연재를 함께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집은 빵 풍년이다. 식빵은 기본이고 소시지 빵과 럭비공 모양의 캄파뉴, 포카치아와 치아바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빵을 시식하느라 바쁘다. 제빵 과정에 등록한 아내가 실습용으로 구운 빵이 곧 다음 날 메뉴다. 첼리스트 요요마가 라틴 리듬을 결합한 ‘오브리가도 브라질’을 틀어놓고 아침 식탁에 어떤 빵이 나올지 기다리는 것도 작은 재미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강조했던 것처럼 나이 들수록 몰입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 빵값 원가 논란으로 시끄러워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주변에 나눌 신한스마트폰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다.
“빵 먹고 어떻게 살아? 밥을 먹어야지!” 젊은 세대의 빵 선호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이 든 세대에게 빵은 아직도 간식의 이미지가 강하다. 서양에서 빵이란 달지 않고 담백한 주식의 의미라면 한국에서 빵은 단팥빵·크림빵 등 달콤한 간식을 먼저 떠올리기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 빵은 포르투갈어 팡(pão)이알라딘사이트
일본을 거쳐 수입돼 정착된 귀화어. 그런 연유로 밥과 빵은 곧 동양과 서양을 상징한다. 17세기 중반 태풍으로 제주도에 왔던 하멜 일행이 작은 배로 탈출을 시도했을 때 배 안에서 빵이 발견됐다. 하멜표류기에 따르면, 조선의 관리는 조사 과정에서 “그런 작은 배로 음료수도 없이 빵 몇 조각만 가지고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물었다고 한다. 제주 보리차트신공
로 만든 빵으로, 네덜란드 선원들의 비상 음식이었다. 하멜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나가사키의 데지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전시관에 들렀을 때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였다. 13년 억류 생활에서 탈출한 하멜을 위로한 고향 음식이었다. 하멜과 동시대에 활동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 ‘우유 따르는 하녀’를 보면 식탁 위에 다트러스제7호 주식
양한 빵이 보이는데,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전시관에 들어서니 식탁 위의 빵과 포도주가 눈에 들어왔다. /손관승 제공
18세기 조선 여행자 이기지주식대회
가 남긴 서양 빵 체험 기록도 흥미롭다. 그는 1720년 북경의 천주당에서 서양 신부들을 만나 여러 차례 빵과 포도주를 접하는 진귀한 체험을 한다. “서양병(西洋餠) 30개가 나왔다. 모양이 조선의 박계와 비슷했는데, 부드럽고 달았으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었다. 만드는 방법을 묻자 사탕과 계란, 밀가루로 만든다고 했다.” 서양병이란 서양 떡, 빵을 뜻하는데 어떤 빵일까? 맛과 재료를 종합해 볼 때 카스텔라 그리고 컵케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음풍농월이 주류였던 시대에 그의 흥미진진한 대륙 여행기 ‘일암연기’는 북학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연암 박지원이 60년 전 선배 여행자처럼 포도주와 카스텔라를 곁들여 서양인과 대화해 보려 북경 남당을 찾아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서양 인문학의 시작이라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도 빵과 포도주는 먼 길 떠나는 자의 양식으로 묘사된다. 직장인과 작가라는 두 개의 삶을 병행했던 프라하의 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직장 일을 가리켜 ‘브로트 베르푸(Brot Beruf)’라 했다. 독일어로 ‘빵(벌기 위한) 직업’이라는 뜻. 즉 돈 버는 일의 고단함이다. 피렌체 출신으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단테는 “남의 빵은 짜다”고 한탄했다.
작품 속에 빵의 의미를 잘 녹여 성공한 작가로 괴테를 꼽을 수 있다. 최초의 출세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젊은 여성 로테에게 처음 반하는 장면에 빵은 큰 역할을 한다. 두 살에서 열한 살까지 동생 여섯을 돌보는 로테가 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빵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뭉클해진 것. “그녀는 검은 빵을 손에 들고는, 자기를 에워싼 어린애들에게 제각기 나이와 식욕에 따라 한 조각씩 쪼개서 아주 다정스레 나눠주었다.” 또 다른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빵의 비유는 유명하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근심에 찬 수많은 밤을/잠자리에서 울며 지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그는 알지 못하리.” 이때부터 ‘눈물에 젖은 빵’은 삶의 고단함을 뜻하는 관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흔히 세상 물정 모르는, 뜬구름 잡는 문인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괴테는 누구보다 열심히 빵값을 벌었던 생활인이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작 손에 쥔 돈은 얼마 안 됐다. 아직 저작권이 미흡해 해적 출판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그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행정가와 경영자로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덕분이다. 괴테의 아포리즘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책상이 아닌 일터의 체험과 생활의 고단함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이다.
‘브레드위너(breadwinner)’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직역하면 빵을 얻어오는 사람이지만,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히 필리핀에서 많이 사용한다. 대부분의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 특히 장남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장녀 혹은 여성의 역할과 헌신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해외의 가사도우미 혹은 노동자로 파견을 자청한 희생자들이다. 글로생활자로서 내가 추구하는 인문학은 우리 삶과 유리된 요설이 아니라 생활에 밀착된 이야기 즉 ‘빵의 인문학’, ‘밥의 인문학’이다. 가족을 위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브레드위너가 나의 작은 영웅들이다. 그동안 영감의 길 연재를 함께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